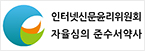"AI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최근 연세대에서 터져 나온 'AI 커닝' 파문은 단순한 부정행위를 넘어 대학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
'자연어처리(NLP)와 챗GPT' 담당 교수는 비대면 중간고사에서 다수의 부정행위 정황을 포착했다. 시험에 응시한 일부 학생들이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문제를 푼 사실이 확인되자 교수는 "자수하면 0점 처리, 숨기면 정학 추진"을 공지했다.
이 사태를 계기로 학내에서는 "AI를 사용한 것이 과연 커닝인가"라는 근본적인 논쟁이 확산했다.
AI를 활용한 숙제 및 시험 부정행위는 이미 해외 주요 대학에서도 광범위하게 보고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영국, 싱가포르, 미국, 호주 등 세계 대학들은 관련 규정을 손질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AI를 금지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교육의 도구로 받아들여야 할지를 두고 전 세계 대학들의 혼란은 이미 현실이 됐다.
◇ 영국, AI 커닝 대거 적발…'활용 신고제' 도입
영국은 AI 부정행위의 규모가 가장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난 국가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2023~2024학년도에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6천900건 이상 적발됐다. 이는 학생 1천명당 5.1건이 넘는 수준으로 이전 학기(1.6건)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수치이다.
이 통계는 AI 오남용을 별도 항목으로 집계한 일부 대학의 수치만을 반영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옥스퍼드, 맨체스터 등 영국의 주요 대학들은 과제에 챗GPT, 코파일럿 등 생성형 AI를 사용했을 경우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는 'AI 활용 신고제'를 도입했다.
영국 대학연합(UUK)은 "AI는 이미 교육 생태계 안으로 깊숙이 들어왔다"며 "이제 문제는 'AI를 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썼느냐'를 평가하는 역량의 문제"라고 분석했다.
◇ 싱가포르, 'AI 출처 공개 의무화'…'비판적 활용'
싱가포르의 경우 AI 부정행위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제도화 속도는 빠른 편이다. 싱가포르 대학의 AI 정책은 학과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싱가포르국립대(NUS)와 난양공과대(NTU)는 AI 사용을 숨기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NTU는 챗GPT 무단 사용으로 학생 3명이 과제 '0점 처리'를 받은 후 모든 과제에서 AI 사용 사실을 명시하는 '출처 공개문' 제출을 의무화했다.
일부 학과의 경우는 오히려 AI 활용을 장려하는 새로운 평가 방식을 도입했다. 학생들에게 AI가 작성한 초안을 제출하게 한 뒤 이 초안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는 AI 생성물의 한계를 인지하고 이를 고유한 사고로 재구성하는 능력을 평가의 중심에 둔 것이다.
싱가포르 교육부는 "AI를 금지할 수는 없다. 대신 스스로 사고한 흔적을 평가의 중심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 미국·호주 "탐지기가 더 위험"…AI 감별 논란
AI로 작성했는지 탐지하는 기술의 불완전성은 미국과 호주에서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미국에서는 AI 탐지기의 정확도가 60~70%에 불과해 무고한 학생이 AI 생성물로 오탐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확산했다.
호주 가톨릭대학교(ACU)의 '로보 커닝' 소동은 이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지난해 ACU에서는 AI 탐지기가 수십 명의 학생을 부정 행위자로 잘못 판정해 정학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조사에서 AI 감지 시스템이 학생 본인이 직접 쓴 고유 문체까지 'AI 작성물'로 오인한 탐지였음이 밝혀져 징계가 전면 취소됐다. 대학 측은 AI 감지기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겠다며 사과했다.
이러한 사례들로 인해 일부 미국 대학은 "AI 감지 결과만으로는 징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학생이 AI를 활용했더라도 사전에 고지했다면 '부정'이 아닌 '참고'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 국내 대학 사실상 AI에 무방비…'관리와 역량 강화' 모색
대부분의 국내 대학은 AI 활용에 대해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지난해 6월 조사에 따르면 전국 대학 131곳 중 77.1%(101곳)는 생성형 AI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공식적인 정책을 적용·채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국내 대학에서는 AI 금지 대신 관리와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서울대는 'AI 활용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 중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하지만 참고 자료로 인용하는 것은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고려대는 계열별 차등 적용을 검토하며 AI 사용 시 출처를 표기하면 허용하는 방향을 논의 중이다. 다만 학과나 교수의 재량에 따라 일부 강좌는 'AI 금지'를 명시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두고 있다.
카이스트는 오히려 'AI 활용형 평가' 실험을 진행 중이다.
AI를 단순히 금지하기보다는 AI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되 그 과정을 설명하고 결과를 검증하도록 하는 '오픈북·AI 결합형 시험' 등을 시범 운영하며 AI를 도구로 적극 수용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성균관대, 한양대 등은 AI를 활용한 과제 제출 시 'AI 사용 고지 의무화'를 논의하며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 대학 교수는 "AI를 금지하는 것은 연필을 쓰지 말라는 말과 같다"며 "이제는 AI를 비판적으로 다루고 활용하는 역량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새로운 방정식…'AI 활용 신고제 + 대면 검증제'
전 세계 대학의 대응은 현재 두 가지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다.
AI 활용 신고제가 대표적으로 학생이 과제에 AI를 사용했다면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용한 내용은 출처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대면 검증제도 많이 쓰인다. 과제 제출 후 발표, 토론, 구술시험 등을 통해 학생의 실제 이해 수준과 고유한 사고의 흔적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국내 대학들은 이 두 방식을 혼합해 AI 부정 방지를 '감시'보다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을 모색 중이다.
'AI 커닝'이라는 단어는 이제 시대착오적인 말이 되고 있다. AI는 이미 학생의 일상 속 학습 파트너로 자리 잡았으며 대학은 교육의 일부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할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AI를 '편법'이 아닌 '도구'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제 교수들은 그 도구의 경계를 새로 그려야 하는 과제 앞에 서 있다.
결국 앞으로의 대학이 가르쳐야 할 것은 '정답을 찾는 법'이 아니라 'AI가 던지는 답을 비판적으로 다루고 의심하는 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