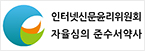5월 1일부터 국내 펫보험(반려동물보험) 시장이 대대적으로 재편된다.
금융당국의 새로운 감독 행정에 따라 기존의 장기·평생 보장형 펫보험은 사라지고 1년 단위 재가입과 본인부담률 인상 등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구조로 전환됐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존 펫보험은 3~5년 단위로 재가입하거나 자동갱신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모든 신규 펫보험 상품이 1년 단위 재가입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이 나이가 들거나 건강상 문제가 생기면 재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급등할 수 있다. 사실상 ‘평생 보장’ 개념이 사라진 셈이다.
치료비 보장률 역시 기존 최대 100%에서 70%로 제한된다. 앞으로는 치료비의 최소 30%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며, 자기부담금도 최소 3만원이 적용된다.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낮은 상품을 선호하던 소비자에게는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의 배경으로 ‘도덕적 해이’와 ‘시장 안정성’ 문제를 들었다.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가 미흡해 과잉진료·보험사기 위험이 높고, 100% 보장 상품이 보험금 누수 및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실손보험에서 나타난 문제를 펫보험이 반복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다.
펫보험 시장은 최근 1~2년 새 빠르게 성장했다. 2024년 상반기 기준 계약 건수는 13만~16만 건, 원수보험료는 300억~400억 원대에 달한다. 하지만 가입률은 1~1.4% 수준에 불과하다. 반려동물 가구가 550만 가구를 넘고 반려동물 개체수는 800만 마리에 육박하지만, 여전히 대다수 보호자는 보험료 부담(48.4%), 좁은 보장범위(44.2%), 낮은 필요성(33.4%) 등을 이유로 가입을 꺼리고 있다.
펫보험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동물병원 진료비의 표준화 부재와 정보의 비대칭이다.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이고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도 없어 보험사로서는 손해사정이 어렵다. 반려동물 등록률도 70%에 그쳐 보험금 부정청구 위험이 상존한다. 일부에서는 동물병원 전자의무기록(EMR) 활용 등 데이터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손해율 관리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시장 성장세가 꺾일 것이라고 우려한다. 장기상품과 낮은 자기부담금 상품을 선호하던 소비자 이탈이 불가피하고, 매년 재가입 심사로 인해 노령견·질병견은 보험 혜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부 보험대리점은 펫보험 판매를 중단하거나 권유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펫보험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으나, 시장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금융위원회가 펫보험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지만 제도적 미비와 소비자 불신, 시장의 구조적 한계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개편은 5월 1일 이후 출시되는 신규 펫보험 상품에만 적용된다. 기존 장기상품 가입자는 갱신 시 기존 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