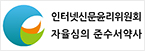규모가 작은 기업보다 큰 기업이 정년 후 재고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고용 임금의 경우 대기업은 기존보다 적게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중소기업은 비슷하게 주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더 주는 경우도 있었다.
29일 한국노동연구원의 '2024년 계속고용 실태조사 :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는 근로자 수 100명 이상 규모의 기업, 그중에서도 제조업 사업체 중 생산기능직과 경영지원직의 재고용 제도 운영 실태를 파악했다.
먼저 전체 조사 대상 614개 기업 중에서 공식적 재고용 인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은 64%(393개 기업)였다.
근로자 수 1천명 이상 규모 기업은 83.9%가 재고용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100∼299명 이하 규모에서는 64%로 조사됐다.
이번 실태 조사는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생산기능직을 재고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8.4%에 불과했다. 경영지원직은 표본 사업체의 46.8%가 재고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기업(97.5%)이 재고용 근로자의 직무가 기존에 수행하던 직무와 동일하다고 응답했다.
재고용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의 경우 경영지원직과 생산기능직에서 각 72.2%, 71.1%가 기존 정규직과는 '다른' 기준·방식으로 임금을 정한다고 응답했다.
기업 규모가 작은 사업체일수록, 무노조 사업체일수록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방식을 적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기존 정규직과는 다른 재고용 근로자의 임금 조정 방식을 '임금피크제'라고 부르는 경우는 두 직무 모두 약 20%에 불과해, 다양한 형태의 임금 조정 방식이 재고용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재고용 근로자의 임금을 기존 정규직과 다른 기준·방식으로 결정한다고 응답한 기업 중 약 83∼84%는 정년 후 재고용 시점에 임금수준을 조정한다고 응답했다.
정년 도달 시점 대비 재고용 계약 시점의 임금수준을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299명 이하 기업 경영지원직의 경우 임금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43.4%, 60∼80%라는 응답이 45.1%였다. 반면 1천명 이상은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16.7%, 60∼80%라는 응답은 83.3%였다.
생산기능직의 경우 격차가 다소 완화됐으나 여전히 100∼299명 이하 규모에서 기존 대비 상대적 임금 수준이 높았다.
100∼299명 이하 규모의 경우 기존보다 많다는 답변도 두 직종 모두에서 약 4%대였다.
정년 이후 경영지원직 및 생산기능직 근로자를 재고용한 이유로는 '고령 인력의 숙련 기술과 우수한 업무 태도'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생산기능직의 경우 경영지원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 절감'이나 '신규 청년 인력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인력난 해소' 등의 응답도 많이 나왔다.
보고서는 "재고용 근로자들이 정년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재고용 시점에서 임금 삭감 여부 및 이후 임금 수준 변화에서 여러 유형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수준의 직무 변화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