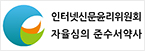금융위원회가 은행권의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 차이) 확대 현상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대출 규제를 병행하면서도 과도한 ‘이자 장사’ 행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은행권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월 1일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 첫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해 예금상품에 직접 가입하고 제도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권 부위원장은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예대금리차가 지속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은행권에 가산금리 체계와 영업 관행 점검을 요구했다.
현재 국내 금융권은 약 4000조 원 규모의 예금을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권이 이자 중심의 대출 영업에 몰두하고 있다는 국민과 시장의 냉정한 평가가 있다”라며 “경기 회복이 더디고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커지는 시점에 은행만 예대마진에 기반한 높은 수익을 보고 있다는 비판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7월 기준 5대 시중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 평균은 1.468%포인트(p)로, 전월(1.418%p)보다 0.05%p 올랐다. KB국민은행이 1.54%p로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1.50%p), 농협은행(1.47%p), 하나은행(1.42%p), 우리은행(1.41%p) 순이었다.
권 부위원장은 “예대마진 중심의 수익성에 집착하기보다는 혁신, 미래 성장, 벤처 등 생산적 금융 분야로 자금이 흘러야 한다”라며 “이번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으로 예금자의 재산 보호가 강화된 만큼, 그 안에 모인 자금이 적절한 곳에 쓰이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융권 내부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와 예대금리차 축소 요구가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예대마진을 축소할 경우 은행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하며, 여기에 가계대출 관리 압박까지 덮치면서 은행권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대출 갈아타기,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비롯해 국회에서 추진 중인 가산금리 관련 법 개정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권 부위원장은 “금리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돼야 한다”면서도 “금융권은 스스로 가산금리 체계와 영업 구조를 점검해 생산적 금융의 핵심 축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됐다. 금융상품의 홍보물·통장 등에 안내문과 로고가 표시되며, 직원은 이를 설명하고 예금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권 부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으로 예금자의 재산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분산 예치에 따른 불편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제도 시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자금 이동 현황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