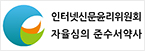국내 주요 대학의 'AI 커닝' 파문이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정규 교육과정의 시작점인 초등학교에서조차 학생들이 AI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동작구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5학년을 가르친 김모(25)씨는 16일 연합뉴스에 "고학년은 자료 조사를 시키면 AI에 물어볼 생각부터 하는 상황"이라며 "AI로 과제를 효율적으로 해내는 게 일종의 자랑거리, 권력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수업에서 '노키즈존' 찬반 토론을 한 일을 예로 들었다. 학생들이 간단히 챗GPT에 '노키즈존 찬성 근거'를 물어보더니, '업주의 재산권, 영업의 자유, 공간의 공공성' 같이 아이들이 떠올리기 어려운 근거를 갖고 왔다는 것이다.
김씨는 "내용을 이해하기도 힘들거니와 자신들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스스로 생각할 기회가 사라진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AI가 사고력과 표현력 훈련을 대체해버렸다는 것이다. 그는 "아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연필도 제대로 못 쥐고 글씨도 제대로 못 쓰는 아이들이 많다. 초등학생 때까지는 AI와 거리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지역 초등교사 박모(28)씨도 "5∼6학년 정도 되면 AI 쓰는 법을 학교에서 배운다"며 "사진 하나 찍어서 수학 문제 풀어달라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이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했다.
박씨는 "AI나 디지털 관련 수업 비중이 높아졌지만, 무너진 기초학습 능력을 세우는 게 먼저"라며 "읽기나 산수가 어느 정도 된 다음 AI를 가르치는 게 공교육의 취지에 더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와 접촉한 초등학생들은 학업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 AI 사용이 스며든 상태라고 입을 모았다.
서초구 한 초등학교 6학년 조모(12)군은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의견이 갈리면 챗GPT에게 누가 맞는지 심판을 봐달라고 한다"며 "학기 초에 회장 선거를 나가면서 (출마) 연설문을 만든 친구도 있다"고 말했다.
6학년 오모(12)군도 "저도 자료 조사를 할 때 찾기 귀찮아 AI에 맡긴 적이 있다"며 "친구는 학교 행사에서 사회를 맡게 됐는데 멘트를 챗GPT에게 맡겼다"고 전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한 학부모들의 생각은 갈린다. 우려가 앞서지만 다가온 AI 시대에 활용 능력을 먼저 갖추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이 교차한다.
조군의 부친(46)은 "우리 세대는 겪어보지 못한 변화이니 걱정이 앞서지만, 한편으로는 AI를 활용 못 하면 도태되는 게 아닌지 생각이 든다"고 털어놨다. 2학년생의 학부모 이모(39)씨는 "딸이 역사 인물 보고서 숙제를 받아왔는데 챗GPT를 이용하게 했다"며 "AI 시대에 아이들이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아직 지적 능력이 미숙한 초등학생의 경우 AI가 학습의 보조적 역할에 그치게끔 공교육 차원에서 AI 활용의 기준과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균관대 양정호 교육학과 교수는 "숙제나 수행평가 질문을 넣고 답을 '복붙'하는 것은 AI를 통해 생각의 여지를 주려는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사고력과 비판적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학생들의 AI 오남용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습을 '외주화' 해버리면 더는 두뇌를 쓰려고 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려는 학교 측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